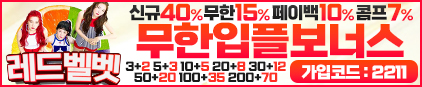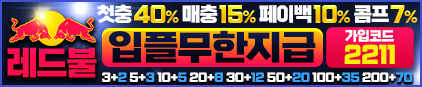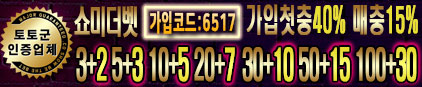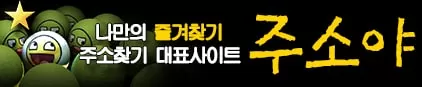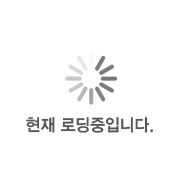야화 44화
야화 44화
장안(長安)에서 제남(濟南)으로 뚫린 남북로(南北路)와, 장청(長淸)에서 제남으로 뚫린 동서로(東西路) 사이에 삼각주(三角洲)처럼 야트막한 구릉(丘陵)이 있었다. 삼각주 같다고 한 것은 구릉 양 옆으로 태산자락에서 흘러내려 황하(黃河)로 흘러 가는 하천이 있기 때문이다. 하천 폭은 넓지 안으나 관도를 따라 황하로 흘러 들어 가는데, 작은 고깃배는 이 하천을 따라 황하를 오르내릴 수가 있었다.
가장 어려운 공사가, 관도와 구릉 사이를 잇는 가교(架橋)였다. 구릉의 구할(九割)은 죽림이었는데., 대나무를 베어 내고 하천을 따라 일자(一字) 집을 지었는데 지붕만 높이 얹고, 벽면은 안에 앉아서 밖이 내다 보이도록 얕았다.
맨 땅 위에 탁자를 가져다 놓았고, 탁자 아래는 땅을 움푹하게 파 내서, 거기에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하였다. 어른 허리통만한 의자가 한 탁자에 네 개씩 놓여 있는 것이 다였다. 한마디로 노천 주점 같으면서 노천이 아니었고 묘한 운치가 있었다.
그 안 쪽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주방이었다, 사람 둘은 들어 갈만한 큰 가마솥이 두 개나 설치 되어 있었고, 그 외로도 두 개의 화덕이 더 있었다. 주방을 지나 그 안 쪽에 아담한 2층 누각을 지었는데, 소박한 노천 주점과는 정 반대였다.
아래층에는 사방에 다섯 개 씩 스무 개의 탁자가 놓여 있고, 중앙에는 불을 피 울 수 있는 큰 화덕이 준비 되어 있었다. 별도로 각 탁자 밑에도 겨울에는 발이 시리지 않도록 자그마한 화로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2층 중앙에는 남쪽과 북쪽 벽에 각각 두 개씩 4개의 탁자가 놓여 있고, 동편으로 세 개 중앙의 서편에 세 개, 모두 합해서 여섯 개의 방이 들어 앉아 있었다. 동편 맨 구석진 방 하나만 빼 놓고는 모두 주석이 마련 되어 있는데, 동편 구석진 방만은 손님을 접견 할 수 있도록 영빈청(迎賓廳)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눈으로 보아도, 공주를 위한 방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 발상하며 설계하며 칭찬 할만 하였다. 천풍엽과 공주가 나타났는데도 자기 할일 만 하고 있을 뿐이었고, 육두자가 따라 다니며 일일이 설명을 하였을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산판자 한 사람이었다.
"산판자는 어디를 간 모양이구려"
"벌써 한 달 전부터, 거지 노인과 함께, 술 맛이 좋다는 곳을 찾아 다니고 있는 줄 압니다"
육두주점(六頭酒店)과 청죽루(靑竹樓)가 완공 된 것은 7월 초순이었다. 그 동안 천 풍림은 여섯 차례나 남경에 다녀 왔다. 새벽에 출발하면 저녁 늦게 돌아 왔다. 함녕 공주가 아무리 무림의 고수라고는 하지만, 깊은 산속에서 혼자 자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주점이 완공 되면서, 교가 난간 양 옆에, 하나는 육두주점 하나는 청죽루라는 깃발이 세워지고, 관도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술 한잔과 만두 두 개를 나누어 주기 시작 한 것이 효과를 보았는지, 손님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 하였다.
주위에 민가라고는 없고, 장안(長安) 장청(長淸) 제남(濟南)의 중간지점에 있는 여기까지, 누가 술을 마시려고 오겠는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싼 값과 맛이 손님을 끌어 들이기 시작을 하였다.
다른 주점처럼 주문 하는 요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날 그 날 사냥을 한 짐승에 따라서 요리가 바뀐다는 것도 색달랐다.
황하에서 잡아 온 팔뚝만한 생선은 일인당 한 마리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였고, 거기에 그 날 사냥을 한 신선한 산 짐승의 고기 맛도 그만인데, 다른 주점에 비한다면 그 값이 반의 반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였다. 거기에 더 하여 술 맛까지 일 품이니 더 말 할 것이 없었다,
7월 한 달은 그럭저럭 심심치 않을 정도로 손님이 들던 것이 날이 더워지는 8월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부쩍 손님이 늘기 시작을 하였다. 관도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들어와 더위를 식히고, 어른들은 술 한잔을, 어린이나 부녀자들은 만두를 먹고 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일 손이 딸리기 시작을 하였다.
장안과 장청 그리고 제남의 개방 제자 중 쓸만한 어린 소년들을 골라 잔심부름을 시키고 그릇을 닦는 일을 돕게 하였다.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 우마차를 태산 자락에 세워 두고 기다리고 있으면, 산속으로 사냥을 나선 발산자가 그 날 사냥을 한 짐승을 둘러매고 내려 와서 우마차에 싣는다.
주로 멧돼지만을 골라 사냥을 한다. 하루에 두 마리 아니면 세 마리를 잡으면 그 다음은 나무를 잘라서 실어야만 했다. 하루에 소비 되는 장작의 량이 엄청 났던 것이다. 개방 제자는 그 동안 토끼 사냥을 한다.
만두 속에 넣을 고기를 장만하는 것이다, 꿩이나 산 비둘기 같은 날짐승은, 천 풍림과 함녕 공주가 산 속에서 내려 오는 길에 여 나무 마리를 매일 잡아 가지고 내려 왔다.
토끼 고기와 날 짐승 고기를 야채와 함께 다져서 만두 속을 만들어 넣는데, 만두를 빚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다. 하루에 적어도 5백 개 이상을 빚어야만 했다. 아침 저녁으로 식구들이 먹는 만두만 하더라도 한끼에 5십 개는 없어지니, 그것만 해도 백 오십 개는 없어지는 꼴이다.
어른 주먹만한 만두 두 개와 생선 한 마리 그리고 산짐승 고기 한 접시가 한 사람의 한끼 분량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량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개방 제자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일손이 딸리는 육두자는 따로 노임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람 손을 빌릴 수 있으니 좋았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값 쌀 수 밖에는 없었다, 술과 야채를 뺀 대부분의 재료가 노력으로 얻은 공짜였기에 싼 값으로 제공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소문이 소문을 낳았다. 무림삼선의 한 사람인 청아수 취선을 거기에 가면 만나 볼 수 있다는 소문과, 공주의 신분을 버리고 무림인이 된 석양봉(夕陽鳳)과 그 짝인 여명황(黎明凰)도 청죽루(靑竹樓)에 가면 만나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무림인 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생명의 위험을 돌보지 않고 역병을 막아 낸 공주의 선행과 용기, 그리고 음양부에 얽힌 전설이 퍼지면서, 석양봉과 여명황의 인기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올라갔다. 물론 그 뒤에는 노회(老獪)한 취아선의 농간이 숨어 있었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취아선은 여간한 일이 아니고는 청죽루에 발을 디디지 않는다. 따뜻한 양지를 골라 앉아서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거나, 양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
청죽루의 술 값은 육두 주점의 술값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비싼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주점에 비한다면 비싸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그 맛에 있었다. 돈이 없는 무림인 들은 육두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 되고, 있는 자는 청죽루에 들어 가면 되는 것이니, 비싸다 싸다 시비 할 일도 없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세상 인심이다. 소문이 나면서 제남의 건달들이 몰려 와서 행패를 부리려다가 팔 한쪽씩을 잃고 나서부터는 파리 떼가 꼬이는 법도 없어졌다.
해시(亥時) 말이 되면 다리 난간 양쪽에 꽂혔던 깃발을 빼고, 묘시(卯時) 초가 되면, 다리 난간에 다시 깃발이 꽂힌다. 깃발이 없다는 것은 장사가 끝 났다는 말이 된다. 하루의 장사가 끝나면 치울 것을 치우고 난 다음 바닥에 거적을 깔고 누워 잠만 자면 되는 것이다.
기를 난간 양 옆에 내다 꽂을 때쯤이면 한판에 만두 이백 개가 들어 가는 큿 가마 솥의 뚜껑이 열리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먹음직스러운 만두가 얼굴을 내민다. 화덕 위에서는 생선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요란한 칼 도마질 소리가, 좀 더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게 만든다.
아침이 기지개를 펴며 깨어 나는 것이다. 우르르 몰려 들어 자기 몫을 챙겨 아침을 먹는 것과는 상관 없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취아선 한 사람 뿐이었다. 그는 일어 나면 아침부터 술 한 사발을 들이키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실 수있는 사람은 그 한 사람뿐이며, 다른 사람들은 술을 입에 대지도 못하게 하였다. 일이 모두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사람 앞에 한 사발 이상은 절대로 주는 법이 없었다. 마음대로 술을 퍼 마실 수 있는 것도 취아선 한 사람의 권리였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여름을 넘기고 가을로 접어들게 되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새벽 잠에서 깨어난 천 풍림이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 보니, 다 죽어가던 금전표가 와 있었다.
"함녕 함녕, 일어나 보구려 금전표가 돌아 왔소"
"어머나... 저것 새끼 아니에요?"
"하하하...새끼를 두 마리씩이나 끌고 오다니..."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면서 시선은 금전표의 시선에 고정을 시기고, 마음 속으로 반갑다는 말과 그 동안 보고 싶었다는 말을 속삭였다. 알아 듣건 말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본능적으로 알아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고양이과의 동물이 모두 그러하듯 끄르렁 끄르렁거리는 것이 자기로서도 반갑다는 표시이며 애교였다.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더니, 그 육중한 몸을 다리에 비벼 댔다. 어미를 따라 새끼들이 재롱을 떨었다. 함녕이 너무 귀여워 새끼 한 마리를 안아 들었는데도 못 본 척을 하는 어미였다.